1. 난세에 등장했던 두 영웅의 등장
퓨전 재즈 시대의 도래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재즈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이 해 봄에 발매된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 <Bitches Brew>가 결정적이었다. 늘 변화를 주도했던 트럼펫 연주자는 몇 해 전부터 새로운 질감의 재즈를 탐구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Bitches Brew>는 그가 이제 탐구를 마쳤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며 동료 연주자들과 감상자들에게 외친 선언이었다. 파격적인 편성과 사운드로 채워진 앨범은 정말 혁명적이었다. 기존 재즈 애호가들로서는 쉽게 수긍하고 따르기 힘든 음악을 담고 있었다. 감히 말한다면 스윙 시대의 종언을 외치며 등장했던 비밥보다 더 과격하고 거칠었다. 재즈 밖에 위치하고 있던 록 음악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었으니 당연했다. 그 결과 퓨전 재즈라 불린 이 새로운 재즈는 재즈보다 록음악에 경도되어 있었던 당대의 청춘들을 사로잡았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록을 재즈로 끌어들이기로 마음 먹었던 것은 음악적 호기심, 탐구욕 때문이기도 했지만 재즈가 대중 음악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 청춘들이 재즈를 잘 듣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퓨전 재즈의 인기는 그로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모던 재즈의 위기
문제는 퓨전 재즈 이전의 재즈였다. 스윙 시대부터 비밥, 쿨, 하드 밥으로 이어지던 재즈는 단번에 낡고 오래된 재즈가 되었다. 모던(Modern) 재즈는 이제 현대가 아닌 근대의 재즈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면 이전 사조는 낡은 것이 되곤 했다. 하지만 사라질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 이전 사조는 그대로 살아 남아 재즈의 두께를 두텁게 했으며 나아가 새로운 사조에 영감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재즈의 변화들은 아무리 혁명적이었다고 해도 반동을 억압하지는 않았다.
퓨전 재즈도 꼭 이전 재즈를 낡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퓨전 재즈가 대중 음악의 지형 변화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의 재즈는 그 무렵 이미 상당한 고사(枯死)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실제 60년대 후반, 특히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당시 재즈의 인기를 이끌었던 존 콜트레인이 세상을 떠난 1967년 이후 재즈 연주자들은 앨범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델로니어스 몽크, 디지 길레스피, 아트 블래키, 찰스 밍거스 등 재즈를 현재성을 유지하던 대표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연주자들은 공백기를 갖거나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아니면 유럽으로 떠났다.
재즈 레이블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독립 재즈 레이블의 대명사였던 블루 노트 레이블은 리버티 사에 매각되었고 그에 앞서 노먼 그랜츠로부터 버브 레이블을 샀던 MGM사는 다시 폴리도르 사에 레이블을 넘겼다. 콜럼비아 사 또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은 꾸준히 제작했지만 다른 유명 연주자의 앨범 제작을 주저했다. 블루 노트 레이블에 버금갈 정도로 모던 재즈의 명반들을 제작했던 프레스티지 레이블도 뉴욕을 떠났다가 여러 장르의 앨범을 제작하던 판타지 사에 매각되었다.
이렇게 보면 퓨전 재즈 이전의 재즈는 축소되어 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길 끝에는 다시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법. 새로운 재즈 레이블이 등장해 퓨전 재즈 이전의 재즈, 스트레이트 어헤드(Straight Ahead) 재즈 혹은 메인스트림 재즈라 불리는 재즈의 명맥을 이어갔다. 파블로와 콩코드 재즈가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레이블은 1973년 같은 해에 설립되어 재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연주자들의 활동을 지속시켰으며 황금기 말에 등장했던 연주자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파블로 레이블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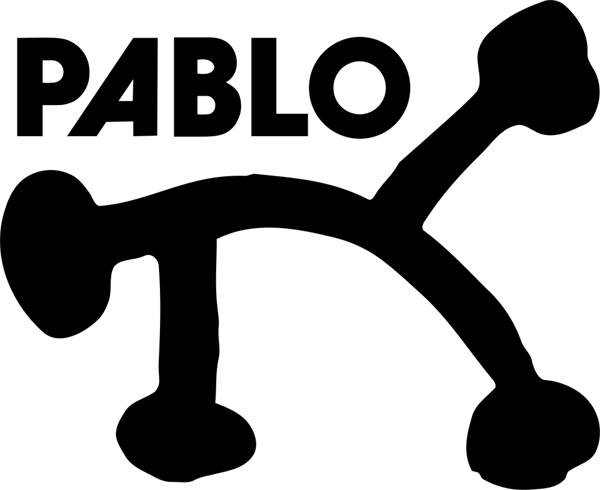
특히 파블로 레이블은 클레프, 노그랜, 버브 레이블을 설립하고 이끌었던 노먼 그랜츠가 설립했다는 점에서 재즈 전통의 지속을 생각하게 했다. 1960년 버브 레이블을 MGM사에 넘긴 후 그는 13년간 스위스에 머물며 앨범 제작과 거리를 두었다. 대신 자신의 집 이름을 “피카소의 집(The House of Picasso)이라 부를 정도로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에 빠져 화가와 친분을 쌓으며 미술품 수집에 열중했다. 그렇다고 재즈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다.
엘라 핏제랄드, 오스카 피터슨의 매니저로서 이들의 공연을 꾸준히 기획했으며 1944년 시작해 버브 레이블 시절까지 꾸준히 기획했던 “재즈 앳 더 필하모닉(JATP)”의 유럽 공연을 다시 기획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그를 다시 앨범 제작으로 이끌었다. 자신이 관리하거나 앨범 제작을 했던 유명 연주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피카소의 이름을 따라 파블로로 레이블의 이름을 결정한 후 그는 자신과 매니지먼트 계약 중이던 엘라 핏제랄드, 오스카 피터슨의 앨범을 중심으로 오래된 연주자들의 앨범을 차근차근 제작해 나갔다. 그 결과 카운트 베이시, 디지 길레스피, 밀트 잭슨, 레이 브라이언트, 베니 카터, 콜맨 호킨스, 허브 엘리스, 주트 심스, 로이 엘드리지 등의 명 연주자들이 앨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 중 사이드 맨으로서 꾸준히 활동했지만 자신의 앨범은 많지 않았던 조 패스 같은 연주자는 솔로 활동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 외에 파블로 레이블 설립 이전에 녹음된 아트 테이텀, 존 클트레인, 자니 허지스, JATP 등의 음원이 앨범으로 발매되기도 했다.
파블로 레이블의 카탈로그는 노먼 그랜츠 시절 버브 레이블의 부활을 생각하게 했다. 발매된 앨범들 또한 훌륭했고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좋았다. 차이가 있다면 버브 레이블은 시대의 유향을 선도하는 느낌을 주었다면 파블로 레이블은 기존 연주자들의 신선한 조합을 시도하고 즉흥성을 강조했음에도 지난 시대의 영광을 지속시키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연주자들의 노쇠한 현재를 가감 없이 담아낸 앨범 표지 이미지들은 레이블이 미래보다는 과거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작과 함께 레이블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레이블 소속 연주자들의 노화는 더욱 심해졌고 재즈의 인기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나마 남은 인기는 새로이 등장한 젊은 연주자들이 차지했다. 한편 감상자들은 노쇠한 연주자들이 젊었던 시절에 만든 앨범을 더 좋아했다. 그 결과 1987년 노먼 그랜츠는 판타지 레코드에 파블로 레이블을 넘겼다. 이 때 그의 나이는 만 70세였다.
콩코드 레이블의 등장

노먼 그랜츠가 파블로 레이블을 설립했던 LA에서 그리 멀지 않은 콩코드에서는 1969년부터 콩코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다. “재즈 인 더 파크(Jazz In The Park)”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 페스티벌은 링컨과 머큐리 자동차 딜러이자 재즈 애호가였던 칼 제퍼슨이 기획한 것으로 유명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그들의 충실한 공연에 힘입어 지역 사회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의 성공에 힘입어 칼 제퍼슨은 재즈 레이블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레이블의 이름은 페스티벌 이름처럼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의 이름을 따라 콩코드라 정했다.
콩코드 재즈 페스티벌이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면 콩코드 레이블은 칼 제퍼슨만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독립 레이블들처럼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 연주자들의 앨범을 차근차근 제작했다. 그의 취향은 특별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이전까지 재즈를 주도 했던, 하지만 퓨전 재즈의 등장 이후 오래된 느낌을 주었던 스트레이트 어헤드 재즈를 좋아했다. 그 가운데 기타 연주자들을 좋아했다.
이에 허브 엘리스, 조 패스, 탈 팔로, 짐 홀, 케니 버렐, 찰리 버드, 바니 케셀 등 재즈 기타의 큰 획을 그은 연주자들의 앨범이 레이블의 초기 카탈로그를 채웠다. 이 외에 로즈마리 클루니, 스콧 해밀튼, 셀리 맨, 버드 섕크, 레이 브라운, 스탄 겟츠, 진 해리스, 마리안 맥파틀랜드, 조지 시어링 등의 연주자들이 레이블을 풍요롭게 했다. 특히 스콧 해밀튼은 레이블을 통해 인기 연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크리스 포터도 마찬가지였다.
복고적인 취향을 지닌 제작자가 운영하는 레이블인만큼 콩코드 역시 파블로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칼 제퍼슨은 취향은 보수적이었는지 몰라도 사업가였던 만큼 레이블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가도록 이끌었다. 1980년 칼 티아더의 앨범을 제작하면서 서브 레이블 콩코드 피칸테(Concord Picante)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재즈와 달리 라틴 재즈를 전문으로 하는 이 서브 레이블은 티나 마리아, 몽고 산타마리아, 티토 푸엔테, 피트 에스코베도, 레이 바레토, 폰초 산체스 등 라틴 재즈의 유명 연주자들의 앨범을 제작했다.
또 다른 위기도 있었다. 칼 제퍼슨이 1995년 만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 하지만 사망 직전 그는 뉴욕으로 직접 날아가 알리언스 엔터테인먼트의 글렌 배러스에게 레이블을 넘겼다. 새로운 레이블의 주인은 1996년 컨템포러리 재즈를 전문으로 하는 서브 레이블 콩코드 비스타(Concord Vista)를 시작하는 한편 칙 코리아가 만든 스트레치 레이블과 제휴하는 등 콩코드의 음악적 영역을 더 확장시켰다. 그 과장에서 사무실을 콩코드에서 비벌리 힐즈로 옮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즈의 전통을 고수하는 독립 레이블로서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다실 칼 제퍼슨의 사망과 함께 독립 레이블로서 콩코드는 사라진 것일 지도 몰랐다. 그러나 연주자를 발굴하고 앨범을 제작하는 것만큼 홍보와 판매에도 신경을 쓴 덕에 콩코드는 지속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재즈, 팝, 록 레이블을 흡수 합병하며 콩코드 뮤직 그룹으로 성장하며 기존 콩코드 카탈로그는 콩코드 재즈로 분류되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레이블은 사라지거나 변화를 겪었지만 재즈의 역사를 지속하고 나아가 불모의 시대일 뻔했던 70, 80년대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재즈 애호가들의 관심이 지극히 현재적인 것이나 1960년대 이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마침 2023년은 파블로와 콩코드 레이블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한 해 동안 두 레이블의 대표 앨범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나갈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