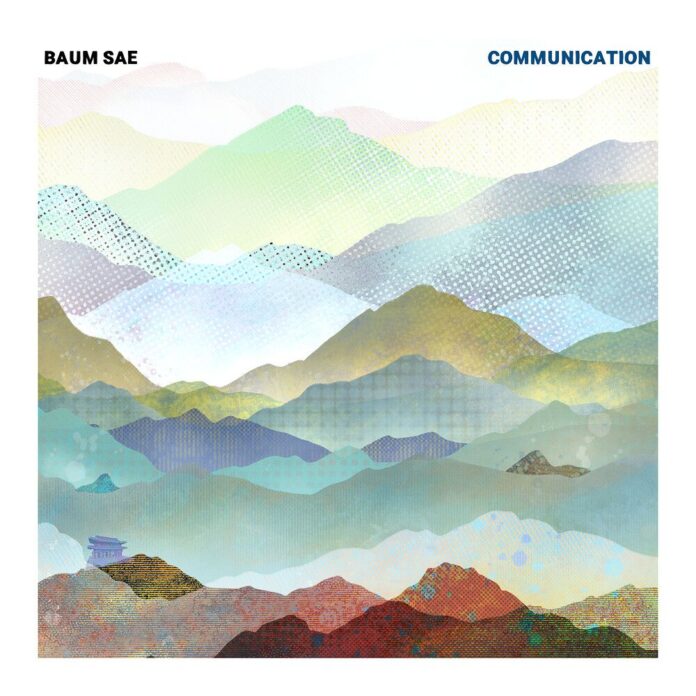자유로운 어울림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
대화란 주고 받음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그 이해란 한 쪽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생각을 단순히 종합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새로운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서로의 합을 넘어서는 무엇을 얻는 것이다. 문명, 문화의 발전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
드럼을 연주하는 서수진, 거문고와 양금을 연주하는 황진아 그리고 “소리”하는 김보림으로 이루어진 트리오 “밤 새”의 앨범은 앨범 타이틀에서 명시되었 듯이 대화가 주제다. 이에 많은 감상자들은 연주자와 악기 구성상 재즈와 국악, 혹은 양악과 국악의 어울림을 생각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크로스오버를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밤 새의 음악은 단순히 장르, 스타일의 교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보통의 국악과 재즈, 양악의 어울림이 악기의 자리 바꿈, 대체 등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되곤 한다면 밤 새에게 장르적 고민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세 연주자는 서로의 어우러짐이 어떤 결과, 어던 음악을 만들어 낼지 궁금해 하며 연주한 것 같다. 방향은 있지만 도착지는 정하지 않는 여정이라고 할까?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국악이면서도 새로운 국악, 양악 혹은 재즈에 속할 수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각을 요구하는 양악 혹은 재즈가 되었다. 아니 장르적 정의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새로움은 장르, 스타일 이전에 정서적인 교감에서 음악을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상이할 수 있는 스타일의 만남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살 殺,虄”, “향수”, “설야 雪野”로 이어지는 대화 3부작만 해도 서수진의 자유로운 드럼 연주와 미디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낸 신비로운 공간에 김보림의 소리와 황진아의 거문고와 양금이 흐르는데 그 어울림이 무척이나 조화롭다.
한편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음악적 대화는 상대에 대한 이해를 이유로 자기 국악 같은 양악 연주, 양악 같은 국악 연주를 피했다. 오히려 세 연주자는 개인적인 음악적 배경을 유지하는 것에 더 집중한 것 같다. “화”가 대표적이다. 이 곡은 김보림과 서수진만의 어울림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곡의 느낌은 판소리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서수진의 드럼은 전통적인 고수의 역할과 다르다. 김보림의 소리의 정서적 굴곡을 따라 자유로이 유동한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고 세 사람이 각각 국악이나 양악을 고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연주를 펼쳤다. 특히 황진아의 거문고와 양금 연주가 그렇다. “삼고초려”, “세월” 같은 곡에서의 연주는 전통적 국악의 질감과 함께 현대적인 맛까지 준다. 어쩌면 황진아가 아니었다면 다른 스타일의 음악의 어울림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음악은 덜 아름다웠을 지도 모른다.
세 연주자는 교감 어린 대화를 통해 그 합을 넘어서는 매혹적인 음악을 만들었다. 그것이 보다 많은 우리 감상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어쩌면 이것이 음악적 대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